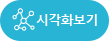| 항목 ID | GC04801932 |
|---|---|
| 한자 | 應製狎鷗亭詩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 |
| 유형 | 작품/문학 작품 |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 집필자 | 정인숙 |
| 저자 생년 시기/일시 | 1420년 - 서거정 출생 |
|---|---|
| 저자 몰년 시기/일시 | 1488년 - 서거정 사망 |
| 배경 지역 | 압구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 성격 | 한시|칠언율시 |
| 작가 | 서거정(徐居正)[1420~1488] |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이 「어제압구정시서」를 쓴 후 한명회의 요구에 따라 그 운에 의거하여 응제하여 지은 한시.
「어제압구정시에 응제하다」는 서거정(徐居正)의 문집 『사가시집(四佳詩集)』 제30권에 수록되어 있다. 압구정(鴨鷗亭)은 조선조 세조에서 성종 대에 걸쳐 높은 벼슬을 했던 한명회(韓明澮)가 만년에 두모포(豆毛浦) 남쪽 언덕에 지어 여생을 보냈던 정자이다. 이 때 성종(成宗)이 친히 「압구정시(鴨鷗亭詩)」를 지어 내렸고 조정의 여러 문사들이 어제(御製)에 화운(和韻)하여 수백 편의 시를 지었다고 한다. 서거정은 이미 「어제압구정시서(御製狎鷗亭詩序)」를 쓴 바 있는데 한명회가 다시 간절히 시를 요구하여 그 운에 의거하여 응제(應製)하여 한시 6수를 지었다. 현재 강남구에는 이 정자의 이름을 붙인 압구정동이 있는데, 강남개발로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지대를 높이고 한강제방을 쌓으면서 원래 정자의 터는 사라졌다.
「어제압구정시에 응제하다」는 칠언율시 6수로 구성되어 있다. 벼슬길에서 물러나 한강변에 압구정을 짓고 여생을 보내는 한명회를 생각하며 압구정 주변의 풍광을 배경으로 담박한 정취를 잘 표현하였다.
삼대원훈제일류(三代元勳第一流)[삼대 조정의 원훈 가운데 제일류로서]
유연고흥만강추(悠然高興滿江秋)[강 가득한 가을에 흥취도 고상하여라]
도형기상기린각(圖形幾上麒麟閣)[초상은 몇 번이나 기린각에 올랐던고]
걸골종기앵무주(乞骨終期鸚鵡洲)[은퇴는 끝내 앵무주를 기약했네그려]
위국증전부일수(魏國曾傳扶日手)[위국에겐 태양을 붙든 솜씨가 전해오거니와]
상가구의제천주(商家久倚濟川舟)[상가에선 내 건너는 배를 오래 의지했었지]
강호불여묘당이(江湖不與廟堂異)[강호가 묘당과 응당 서로 다를 것 없나니]
우국우민역자수(憂國憂民亦自愁)[나라와 백성 걱정에 또한 시름일 뿐일세]
종남산압한강류(終南山壓漢江流)[종남산은 한강의 흐름을 굽어보고 있는데]
신구화정별양추(新構華亭別樣秋)[특별한 가을에 화려한 정자 새로 지었네]
천상하시강규벽(天上何時降奎璧)[천상에선 그 언제 규벽이 내려왔던고]
인간시처유영주(人間是處有瀛洲)[인간엔 여기에 바로 영주가 있었구려]
사안이랍등산극(謝安已蠟登山屐)[사안의 등산할 나막신은 이미 밀칠했지만]
범려무심범해주(范蠡無心泛海舟)[범려의 바다에 배 띄울 마음은 없고말고]
안견태평무사일(眼見大平無事日)[태평 무사한 세월을 눈으로 직접 보거니]
종용진퇴부하수(從容進退復何愁)[조용히 진퇴하면 또 시름할 게 뭐 있으랴]
어찰휘휘영벽류(御札暉暉映碧流)[찬란한 어찰은 푸른 강물에 으리비치고]
강산동색우신추(江山動色又新秋)[강산의 경색은 변하여 또 새로운 가을인데]
조회북극황룡궐(朝回北極黃龍闕)[북쪽 대궐로부터 퇴청하여 돌아오거든]
내상남강백로주(來賞南江白鷺洲)[남쪽 강 백로주로 와서 완상을 하는구려]
녹야소요개별서(綠野逍遙開別墅)[녹야엔 별장이 있어 이리저리 배회하고]
감호귀거유고주(鑑湖歸去有孤舟)[감호에 돌아가면 외로운 배도 있다마다]
백두경경단심재(白頭耿耿丹心在)[백발에도 님 못 잊는 일편단심이 있거니]
일반하망연주수(一飯何忘戀主愁)[잠시나마 어찌 님 그리는 시름을 잊을쏜가]
강호만절가풍류(江湖晩節可風流)[만년에 강호의 풍류를 누릴 만하여라]
아상고명용기추(雅尙高名聳幾秋)[고상한 명성이 그 몇 해를 우뚝했던고]
화동주렴등각우(畫棟珠簾滕閣雨)[화동 주렴은 등왕각의 비를 연상케 하고]
청천방초한양주(晴川芳草漢陽洲)[청천 방초는 한양의 모래섬이 생각나네]
청산요조장당호(靑山窈窕長當戶)[청산은 수줍은 모습으로 길이 문 앞에 섰고]
백구안한불피주(白鷗安閑不避舟)[백구는 한가로워라 배도 피하지를 않누나]
막견시비성도이(莫遣是非聲到耳)[행여 시비의 소리가 귀에 이를 리 없으니]
취향천지백무수(醉鄕天地百無愁)[취향의 별천지에 아무런 시름도 없고말고]
건곤납납수장류(乾坤納納水長流)[하늘땅은 광대하고 물은 길이 흐르는데]
주홀간산우일추(拄笏看山又一秋)[홀로 턱 괴고 산 보니 또 한 가을이로세]
북악초요탱벽락(北岳岧嶤撑碧落)[북악산은 우뚝하여 푸른 하늘을 받치고]
서호은영접창주(西湖隱映接滄洲)[서호는 보일락 말락 창주에 연닿았는데]
곡강장상시환제(曲江張相時還第)[곡강의 장상은 당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적벽소선일범주(赤壁蘇仙日泛舟)[적벽의 소선은 날로 뱃놀이를 즐기었지]
호시공성명역수(好是功成名亦遂)[공을 이루고 명성도 이루었으니 좋고말고]
감련기국만생수(堪憐杞國謾生愁)[기국의 부질없는 시름이 가련하기만 하네]
불필명시퇴급류(不必明時退急流)[태평한 때라 굳이 급류에서 용퇴하지 않고]
위사퇴식낙청추(委蛇退食樂淸秋)[의젓하게 퇴식하며 맑은 가을을 즐기누나]
계산도화왕유망(溪山圖畫王維輞)[계산의 그림은 왕유의 망천도와 똑같고]
운물풍류사조주(雲物風流謝朓洲)[운물 경치 풍류는 사조의 물가와도 같네]
사업기년류한간(事業幾年留汗簡)[사업은 무궁한 후세에 역사로 남으려니와]
강호무일불허주(江湖無日不虛舟)[강호엔 하루도 빈 배를 안 띄운 날 없어라]
당시아망귀왕사(當時雅望歸王謝)[당시의 높은 명망이 왕사로 돌아가거니]
감향하간부사수(敢向河間賦四愁)[감히 하간을 향하여 사수 시를 지을쏜가]
「어제압구정시에 응제하다」는 6수에 걸쳐 모두 제2구에 추(秋), 제4구에 주(洲), 제6구에 주(舟), 제8구에 수(愁)의 운자를 썼다.
성종이 친히 지어 내린 압구정시에 화운하여 당시 여러 문사들이 시를 지었는데 서거정의 「어제압구정시에 응제하다」는 6수에 걸쳐 운자를 반복해 쓰면서 담박한 정취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